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
오드리 탕과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기술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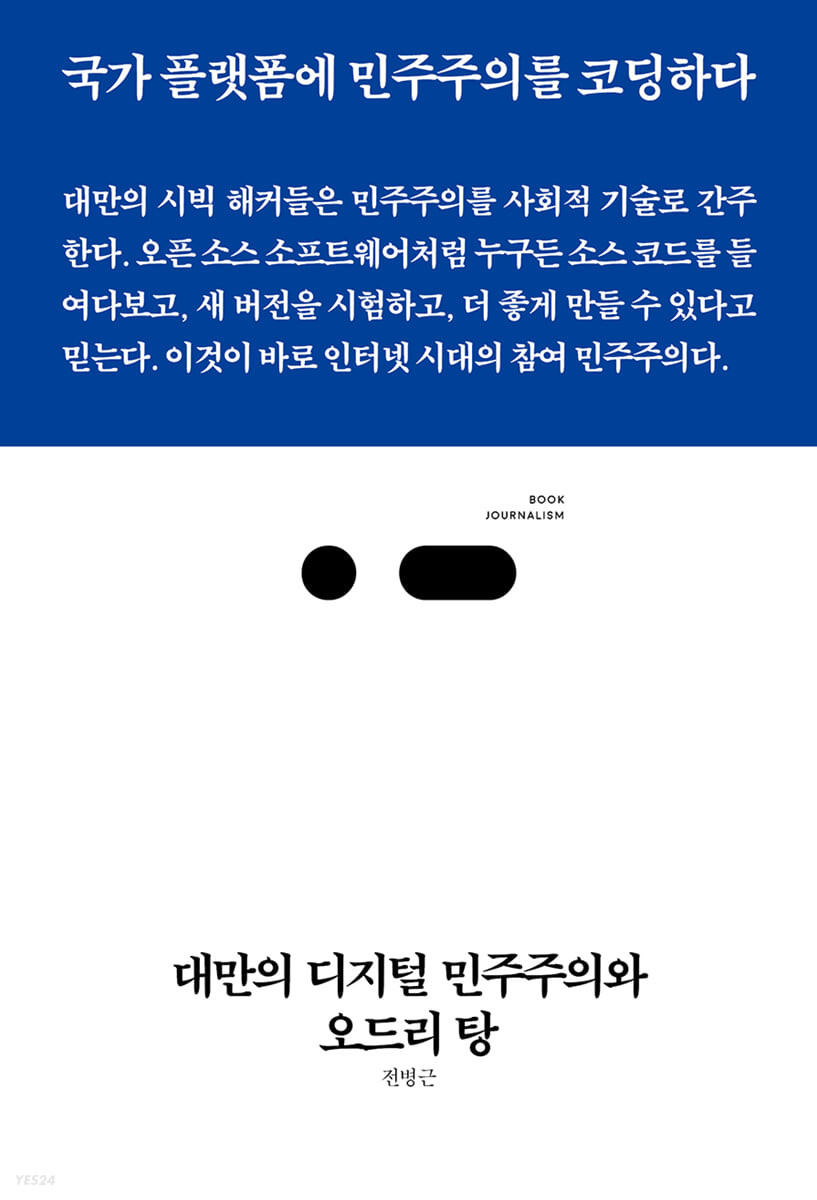
서점에서 책들을 구경하다 궁금한 책을 하나 발견했다.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와 오드리 탕이다. 2022년 연말에 다녀왔던 대만 여행이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관심을 끌었다. 이전에 아는 동료분께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이 기억났다. 당시에는 특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기억이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더 크게 만들었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비행기로 약 3시간가량만 타고 가면, 타이베이에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나는 그동안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해 꽤 무지했던 것 같다. 오드리 탕을 구글에 검색해 보면, 대만의 디지털 정무위원이라 나온다. 좀 더 친숙한 말로 풀어쓰면, 디지털 장관이 될 것이다. 오드리 탕의 삶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의 대만에서 일어난 해바라기 운동 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대만의 학생들이 국회를 점거하여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운동에 디지털 기술들이 밑바탕이 되어, 기술이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대만의 역사에 대해 깊게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이러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이 되었고, 대만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 같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이 일어난 후, 오드리 탕은 본격적으로 대만 내각에서 대만 사회에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 가장 많은 효과를 보였던 정책으로는 아마 코로나 관련된 정책들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초기에, 대만은 국제적으로 마스크 수급을 안정적으로 처리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공에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만 사회는 2003년 SAS 가 창궐하였을 때,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에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많은 대책을 세워 개선을 이루려 노력하였고,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재고량을 넉넉히 두는 것이었다. 다른 요인으로는 국가의 유연한 디지털 기술 지원이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지도가 유행한 것과 비슷하게, 대만에서는 민간 개발자가 개발한 마스크 수급 지도가 있었다. 한 오픈소스 개발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예상치 못한 사용량 증가가 큰 문제였다. 특히 구글 API 사용료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자, 더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오드리 탕은 이 프로젝트에 국가 예산을 지원해,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다. 오픈소스 개발자였던 오드리 탕은, 해당 서비스에 추가적인 국가 데이터를 연동하여, 더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꽤나 파격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 정부 자체를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이해하고 있는 오드리 탕이어서 가능한 정책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지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국민청원 또한 대만에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왔던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도 놀라웠다. 민주주의와 소프트웨어는 그동안 잘 매칭되지 않던 단어들이었지만, 오드리 탕은 기술과 민주주의가 충분히 시너지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 대만에서 이러한 유연한 정책을 실행해왔던 이유는, 오드리 탕이 가지고 있던 다음의 신념 때문이라 생각한다. 바로 오픈소스 정신에서 많이 차용되는, Rough Consensus and Running Code 이다. 코드를 작성하고 운영하다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려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다. MVP 기능만을 개발하여 시장의 반응을 보고, 차차 개선점을 추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IT 서비스의 발전과정이다. 오드리 탕은 이러한 정신이 한 나라의 정부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방된 마음으로 시민들의 만을 경청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실행해 보고, 더 좋은 방향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모든 정책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대만의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비교적 최근에 발전하였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지만, 대만은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1992년이 되어서야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그 이후에, 대만은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기술과 민주주의는 같이 서로 시너지를 이루며 발전해왔고, 많은 선진국들에서도 대만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는 그것만으로도 매우 흥미롭지만, 나는 엔지니어인 오드리 탕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느꼈다. 흔히 엔지니어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싶다. 하지만 오드리 탕의 예시를 보면, 엔지니어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대만의 민주주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진화시키고 있다. 나 또한 기술적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나의 기술적 능력을 환원해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드리 탕은 Civic Hacker 라고 부르지만, 나는 Civic Hacker 는 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멋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이것도 읽어보세요